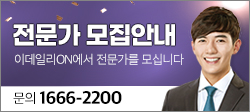[평창]"동료 테니스 부러웠던 판사, 패럴림픽 선수촌장 됐죠"
- 법조인 출신 박은수 패럴림픽 선수촌장 인터뷰
- 메달리스트 촌장 맡던 관행 깨고 깜짝발탁
- 88년 서울 패럴림픽 보고 장애인 스포츠 눈떠
- "율사보다 장애인 스포츠 행정가로 남고 싶어"

박은수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선수촌장이 선수촌 건물 앞에서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반다비의 동작을 따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평창=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깜짝 발탁’ 지난 1월 17일. 평창 동계패럴림픽 선수촌장으로 박은수(63) 변호사가 임명되자 모두가 깜짝 놀랐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선수촌장을 맡던 기존 관행을 깼기 때문이다. 외신도 주목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박 촌장 본인이다. 그는 “평소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은 있었지만 패럴림픽 선수촌장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그러나 그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휠체어 테니스 국제 대회인 대구오픈을 만들고 대구 달구벌 종합스포츠센터 관장, 대구시 휠체어농구단 단장 등을 거치는 등 장애인 스포츠 확산에 기여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패럴림픽 선수단 입촌식을 시작으로 선수들 응원까지 선수촌장으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박 촌장을 평창 패럴림픽 선수촌에서 만났다.
사법시험 붙고도 판사임용 제외..“장애인 운동에 눈 떠”
박 촌장은 “첫 돌이 막 지났을 무렵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장애인으로 직업을 가지려면 공부를 열심히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했다.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다.
그러나 바로 판사가 될 수 없었다. 법원이 그를 포함한 장애인 4명의 임용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촌장은 “당시 합격자는 1년에 140명 정도였다”며 “사법시험이 판·검사 선발시험 성격을 띠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차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용을 포기하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 후배들에게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단 하루라도 판사를 해야겠다는 각오였다”고 말했다.
박 촌장은 장애인 동기들과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법원에 맞서 싸우기로 했다. 관련 소송과 여론전을 시작한 것.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할 법원이 가장 차별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법원은 이들의 임용을 허가하게 된다. 박 촌장이 선택한 곳은 대구지방법원. 그는 “연수원 생활을 하며 서울에서 느꼈던 차별이 너무너무 싫었다”며 “고향에서 살기 위해 대구를 택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스포츠 성장시킨 88올림픽
그가 판사로 임용된 1983년은 한국 장애인 스포츠가 싹을 틔운 시점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함께 열리는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는 “이전까지는 장애인을 인간 취급도 안 했다”며 “당연히 패럴림픽에 출전할 선수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1985년, 정부가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서울 장애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민간 주최로 열리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주관을 맡은 것.
개최지는 육군의 군사훈련 기관인 상무대였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선수를 군인들이 직접 업고 이동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장애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메달 하나 못 따면 어떻게 하나’하는 정부의 걱정이 만든 웃지 못할 촌극이었다.
그렇게 열린 1988년 서울패럴림픽. 박 촌장은 이 대회에서 시범경기를 보고 휠체어 테니스에 빠져들었다. 그는 “판사시절 법원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즐기던 동료들을 바라보기만 했다”며 “그 운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고 회상했다. 다른 종목과 달리 경기용 휠체어 두 대와 라켓만 있으면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도 그의 관심을 끌었다.
“휠체어 테니스, 코치 없어 직접 만들기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박 촌장은 1990년 휠체어 테니스에 관심 있는 사람 5명을 모아 테니스단을 꾸렸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다. 바깥쪽으로 경사진 바퀴가 달려 있는 경기용 휠체어는 1대당 500만원을 호가했다.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과 맞먹는 액수다. 박 촌장은 “그래도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사비를 털어 5대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단원을 모으고 장비까지 갖췄지만 막상 테니스를 쳐 본 사람이 없었다. 수소문 끝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재활병원에서 휠체어 테니스를 가르쳐준다는 소식을 들었다. 담당 선생님을 대구로 초청해 레슨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레슨 시간은 단 하루뿐이었다. 박 촌장이 꾀를 냈다. 효성여대(현 대구가톨릭대) 테니스 선수를 초빙해 배우도록 한 것. 휠체어 테니스 코치를 직접 만든 셈이다.
코치의 첫번째 원칙은 절대복종이었다. 박 촌장은 “처음에는 라켓도 못 잡게 하고 런닝만 시켰다”며 “코치님이 앞에서 뛰면 우리가 바퀴를 굴리며 따라갔다”고 말했다. 기초부터 실력을 쌓아가던 테니스단은 일본에서 열리는 후쿠오카 오픈에 참가하게 된다. 개인자격이었지만 국내에 휠체어 테니스 선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가대표였다. 박 촌장은 처음 출전한 이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대구지역 신문사를 섭외해 ‘대구 오픈’을 만들었다. 박 촌장은 “기량이 좋은 선수들을 모시기 위해 비행기표와 숙박을 지원했다”며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만들어야한다는 논리로 대구시를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1997년 첫대회에서 4개국 2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흥행을 거뒀다. 20회를 훌쩍 넘긴 대구오픈은 이제 10여개국 1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대회로 자리를 잡았다.
“장애인 스포츠 행정가로 남고 싶어”
이후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관장과 대구시 휠체어농구단 단장을 역임한 그는 대구 볼런티어센터 소장, 노장지협(노인과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드는 시민단체 협의회) 사무총장 등을 맡기도 했다. 박 촌장은 “이 단체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가교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강조했다. 2004년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그저 스포츠를 좋아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삶을 살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왔다”고 말했다. “법조인보다 장애인 스포츠 행정가로 남고 싶다”는 박 촌장은 “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 스포츠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수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선수촌장이 선수촌 내 자원봉사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저작권자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놓치면 안되는 뉴스
지금 뜨는 뉴스
추천 읽을거리
VOD 하이라이트
이데일리ON 오늘의 전문가 방송
이데일리ON 전문가 베스트
-
Best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
Best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
Best
서동구 매직차트
[매직차트] 빅데이터 + AI트레이딩 솔루션


-
Best
주식와이프
▶주식과 결혼하세요◀


![[단독]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빨간불...4500억 블루원 매각 무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300829t.jpg)
![(영상)민희진과 뉴진스, 그리고 아일릿[이혜라의 앵커나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300513t.jpg)



![[이지혜의 뷰]3高(고)에 신음하는 증시..실적이 답](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30081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