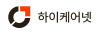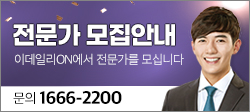K바이오에 국내 사모펀드는 쪽박, 해외 사모펀드는 대박인 까닭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2022년 메디포스트(078160)를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인수한 이후 바이오·헬스케어 섹터에서 사모펀드의 인수합병(M&A)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게 됐다. 사모펀드 피인수 후 기업들의 성적표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명암을 가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 피인수 뒤 휘청대는 바이오·헬스업체 ‘수두룩’
눈에 띄는 점은 해외 사모펀드에 인수된 곳들은 비교적 선방했지만 국내 사모펀드에 인수된 곳들은 실적이 악화되거나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인수 주체인 사모펀드조차 본전도 건지기 힘들 정도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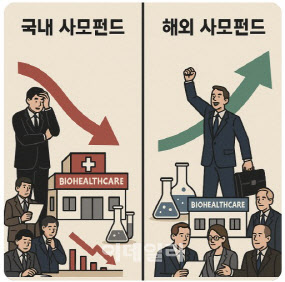
루하프라이빗에쿼티(루하PE)는 랩지노믹스(084650)의 전환사채를 주당 7260원에 인수하고 진승현 대표의 구주 287만1395주를 주당 2만880원에 사들였지만 현재 랩지노믹스의 주가는 2225원에 불과하다. 전환사채 인수가를 기준으로 봐도 주가가 69.4%나 하락한 셈이다. 뉴레이크 품에 안긴 CG인바이츠(083790)도 주당 2952원에 인수됐는데 현재 주가는 2065원으로 3분의1토막 났다.
MBK파트너사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에 인수된 이후 비상장사가 된 오스템임플란트와 UCK에서 MBK의 품으로 넘어간 비상장사 메디트의 경우 실적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MBK에 인수되기 이전 실적이 탄탄하게 성장했던 오스템임플란트는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지난해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인수 전까지 실적이 급성장했던 메디트도 인수 직후인 2023년 매출이 반토막내고 적자 전환했다.
해외 사모펀드 인수 이후 승승장구…군계일학은 클래시스
반면 해외 사모펀드가 인수한 곳들은 비교적 준수한 성적표를 내보이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헬스케어 전문 사모펀드 아키메드(Archimed)에 인수된 제이시스메디칼은 지난해 매출이 1921억원으로 전년 대비 34.3%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400억원으로 10.1% 늘었다. 아예 경영권이 인수된 케이스는 아니지만 유럽계 CVC캐피탈이 지분 투자한 파마리서치(214450)는 실적뿐 아니라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파마리서치의 지난해 매출은 3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34.1% 늘고 영업이익은 1261억원으로 36.6% 급증했다. CVC캐피탈이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공시 전일(2024년 9월 4일) 16만7700원이었던 주가는 지난 17일 36만2500원으로 2.2배로 뛴 상태이다.
해외 사모펀드에 인수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중 기업가치가 순조롭게 성장해온 모범 사례로는 클래시스(214150)가 꼽힌다. 클래시스는 2022년 베인캐피탈이 창업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 60.8%를 6700억원에 인수한 미용의료기기업체이다. 클래시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인수 전인 2021년 1006억원이었던 클래시스의 매출은 지난해 2429억원으로 141.5%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17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136.8% 늘었으며 순이익도 438억원에서 975억원으로 122.7% 증가했다.
베인캐피탈은 클래시스 인수 전 미용의료기기 업체 휴젤(145020)을 2017년 9274억원에 인수한 뒤 2021년 1조7000억원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모펀드이다. 베인캐피탈은 휴젤을 GS 컨소시엄에 넘기면서 내부수익률(IRR) 20%를 상회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베인캐피탈의 휴젤 엑시트에 따른 수익률은 아쉬운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조 단위 차익을 누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면에서도 클래시스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에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베인캐피탈은 클래시스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현재 JP모건과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인캐피탈이 제시한 매각 희망가는 3조원 규모로 인수가(6700억원)의 4.5배에 달한다. 인수 후보들은 적정 가격을 2조원대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베인캐피탈의 인수가에 비하면 3배 수준이다.
국내외 사모펀드 명암 가른 요인은?
이처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국내 사모펀드와 해외 사모펀드의 명암이 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선 △해외 사모펀드와 달리 어려운 사업 분야를 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기업 경영 경험, 해외 네트워킹 등 인력과 전문성 부족 △정부 규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의 역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짧은 편이다. 한국 금융당국이 2004년 12월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2006년 IMM프라이빗에쿼티가 1호 PEF로 등록하면서 국내 사모펀드의 역사가 시작됐다. 가장 오래된 국내 사모펀드가 20년 차를 맞이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인력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한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는 “인력 구성이나 자본,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들을 세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국내 사모펀드의 역사가 짧다 보니 금융에 대해서는 잘 알더라도 사업 운용이나 기업 경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 사모펀드가 애초에 선택지가 좁아 어려운 사업 분야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국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체는 주로 자녀들에게 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일이 좀처럼 없다. 반면 바이오·헬스케어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가족이라 해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승계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직종의 회사를 인수하기보다는 승계가 어려운 고난이도의 기술과 더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회사를 맡게 된다”며 “해외 사모펀드보다 어려운 업종의 인수를 많이 결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 비해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한 회사가 정상화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줘야 하는데 국내 사모펀드에서는 너무 단기적 시각에서 접근한다”면서 “그렇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모펀드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지만 국내 사모펀드는 빨리 엑시트하려고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해외 사모펀드는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다 보니 태도면에서도 여유로운 것 같다”고 평했다.
해외 사모펀드의 경우 풍부한 해외 네트워킹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력한 메리트로 작용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사모펀드는 국내 사모펀드와 글로벌 영향력 측면에서 레벨이 다르다”며 “국내에선 대기업도 신약 출시 이후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을 뚫는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아주 획기적인 신약이 아닌 이상 결국 글로벌 마케팅이 중요한 건데 해외 사모펀드는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있다보니 이걸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 외에 국내 정부의 규제 환경도 국내외 사모펀드의 명암을 가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인력 구조조정에 예민하기 때문에 국내 사모펀드의 경우 기업 쇄신을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환골탈태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를 실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내 사모펀드 피인수 뒤 휘청대는 바이오·헬스업체 ‘수두룩’
눈에 띄는 점은 해외 사모펀드에 인수된 곳들은 비교적 선방했지만 국내 사모펀드에 인수된 곳들은 실적이 악화되거나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인수 주체인 사모펀드조차 본전도 건지기 힘들 정도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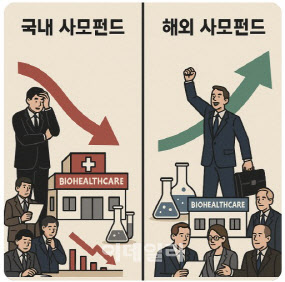
국내외 사모펀드 명암(이미지=ChatGPT 활용)
일례로 메디포스트의 경우 당시 사모펀드가 경영권 인수를 위해 사들인 의결권부 전환우선주는 주당 1만8715원이었다. 창업주인 양윤선 대표로부터 사들인 구주 40만주는 주당 5만원으로 쳐줬다. 18일 기준 메디포스트의 주가는 8580원에 불과하다. 인수 당시 신주발행가액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루하프라이빗에쿼티(루하PE)는 랩지노믹스(084650)의 전환사채를 주당 7260원에 인수하고 진승현 대표의 구주 287만1395주를 주당 2만880원에 사들였지만 현재 랩지노믹스의 주가는 2225원에 불과하다. 전환사채 인수가를 기준으로 봐도 주가가 69.4%나 하락한 셈이다. 뉴레이크 품에 안긴 CG인바이츠(083790)도 주당 2952원에 인수됐는데 현재 주가는 2065원으로 3분의1토막 났다.
MBK파트너사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에 인수된 이후 비상장사가 된 오스템임플란트와 UCK에서 MBK의 품으로 넘어간 비상장사 메디트의 경우 실적이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MBK에 인수되기 이전 실적이 탄탄하게 성장했던 오스템임플란트는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지난해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인수 전까지 실적이 급성장했던 메디트도 인수 직후인 2023년 매출이 반토막내고 적자 전환했다.
해외 사모펀드 인수 이후 승승장구…군계일학은 클래시스
반면 해외 사모펀드가 인수한 곳들은 비교적 준수한 성적표를 내보이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헬스케어 전문 사모펀드 아키메드(Archimed)에 인수된 제이시스메디칼은 지난해 매출이 1921억원으로 전년 대비 34.3%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400억원으로 10.1% 늘었다. 아예 경영권이 인수된 케이스는 아니지만 유럽계 CVC캐피탈이 지분 투자한 파마리서치(214450)는 실적뿐 아니라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파마리서치의 지난해 매출은 3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34.1% 늘고 영업이익은 1261억원으로 36.6% 급증했다. CVC캐피탈이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공시 전일(2024년 9월 4일) 16만7700원이었던 주가는 지난 17일 36만2500원으로 2.2배로 뛴 상태이다.
해외 사모펀드에 인수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중 기업가치가 순조롭게 성장해온 모범 사례로는 클래시스(214150)가 꼽힌다. 클래시스는 2022년 베인캐피탈이 창업자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 60.8%를 6700억원에 인수한 미용의료기기업체이다. 클래시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인수 전인 2021년 1006억원이었던 클래시스의 매출은 지난해 2429억원으로 141.5%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17억원에서 1224억원으로 136.8% 늘었으며 순이익도 438억원에서 975억원으로 122.7% 증가했다.
베인캐피탈은 클래시스 인수 전 미용의료기기 업체 휴젤(145020)을 2017년 9274억원에 인수한 뒤 2021년 1조7000억원에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모펀드이다. 베인캐피탈은 휴젤을 GS 컨소시엄에 넘기면서 내부수익률(IRR) 20%를 상회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베인캐피탈의 휴젤 엑시트에 따른 수익률은 아쉬운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조 단위 차익을 누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면에서도 클래시스는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에 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베인캐피탈은 클래시스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현재 JP모건과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인캐피탈이 제시한 매각 희망가는 3조원 규모로 인수가(6700억원)의 4.5배에 달한다. 인수 후보들은 적정 가격을 2조원대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베인캐피탈의 인수가에 비하면 3배 수준이다.
국내외 사모펀드 명암 가른 요인은?
이처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국내 사모펀드와 해외 사모펀드의 명암이 갈린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에선 △해외 사모펀드와 달리 어려운 사업 분야를 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기업 경영 경험, 해외 네트워킹 등 인력과 전문성 부족 △정부 규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의 역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짧은 편이다. 한국 금융당국이 2004년 12월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2006년 IMM프라이빗에쿼티가 1호 PEF로 등록하면서 국내 사모펀드의 역사가 시작됐다. 가장 오래된 국내 사모펀드가 20년 차를 맞이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인력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한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김현욱 현앤파트너스코리아 대표는 “인력 구성이나 자본,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들을 세팅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국내 사모펀드의 역사가 짧다 보니 금융에 대해서는 잘 알더라도 사업 운용이나 기업 경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 사모펀드가 애초에 선택지가 좁아 어려운 사업 분야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국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체는 주로 자녀들에게 승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일이 좀처럼 없다. 반면 바이오·헬스케어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가족이라 해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승계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직종의 회사를 인수하기보다는 승계가 어려운 고난이도의 기술과 더 많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회사를 맡게 된다”며 “해외 사모펀드보다 어려운 업종의 인수를 많이 결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 비해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한 회사가 정상화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줘야 하는데 국내 사모펀드에서는 너무 단기적 시각에서 접근한다”면서 “그렇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모펀드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지만 국내 사모펀드는 빨리 엑시트하려고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해외 사모펀드는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다 보니 태도면에서도 여유로운 것 같다”고 평했다.
해외 사모펀드의 경우 풍부한 해외 네트워킹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강력한 메리트로 작용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사모펀드는 국내 사모펀드와 글로벌 영향력 측면에서 레벨이 다르다”며 “국내에선 대기업도 신약 출시 이후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을 뚫는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아주 획기적인 신약이 아닌 이상 결국 글로벌 마케팅이 중요한 건데 해외 사모펀드는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있다보니 이걸 활용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 외에 국내 정부의 규제 환경도 국내외 사모펀드의 명암을 가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인력 구조조정에 예민하기 때문에 국내 사모펀드의 경우 기업 쇄신을 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면서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환골탈태를 해야 할 때도 있는데 이를 실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새미 기자bird@edaily.co.kr
저작권자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놓치면 안되는 뉴스
지금 뜨는 뉴스
추천 읽을거리
VOD 하이라이트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19
- 김현구의 주식 코치 1부 (20250419)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21
- 마켓시그널 (20250421)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19
- 이난희의 333 (20250419)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23
- 신대가들의투자비법 - 성명석 주식 세뇌 탈출 (20250423)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18
- 코인 트렌드 (20250418)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18
- 파이널 샷 (20250418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18
- 애프터 마켓 (20250418)
-
-
-

- 무료 / 인기 / TOP 2025.04.18
- 주식 클래스 (20250418)
-
이데일리ON 파트너 무료방송
이데일리ON 파트너
-
Best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
Best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
Best
서동구
안정적인 수익을 복리로 관리해 드립니다!


-
김선상[주도신공]
실전 최고수들만 아는 기법으로 고수익 창출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투자의 승부사


-
주태영
대박 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
홍프로
홍프로의 시크릿테마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
박정식
평생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


-
이용철
검색기를 통한 주도주 매매로 수익 극대화 전략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
추세 지지선 매매로 수익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