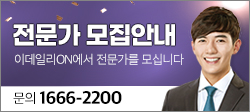'캐디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남자 골퍼들의 말 못할 고민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에서 캐디와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정대억. (사진=KPGA)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캐디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어요.”한국남자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 2019 시즌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1라운드를 하루 앞둔 17일 경기도 포천시 대유 몽베르 컨트리클럽. 선수들이 연습 그린에 모여 전지훈련을 어디로 다녀왔는지부터 새로 바꾼 클럽, 스윙 교정 등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선수들이 한숨을 내쉬게 하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캐디다. 올 시즌 KPGA 코리안투어에서 뛰는 몇몇 선수들은 올 시즌을 함께할 캐디를 구하지 못해 속앓이 중이다.
KPGA 코리안투어에서 4년째 활약하고 있는 유송규(23)는 “1년 투어 생활을 같이할 캐디를 구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며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과 NS홈쇼핑 군산CC 전북오픈 때 호흡을 맞출 캐디도 가까스로 구했다”고 말했다.
골프에서 선수와 캐디는 바늘과 실에 비유된다. 그만큼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다. 캐디는 선수에게 코스 안에서 유일하게 조언할 수 있는 존재다. 반대로 말하면 선수가 의존할 수 있는 건 캐디뿐이다. 결정적인 승부 혹은 위기에서 캐디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캐디는 선수의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긴장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캐디들은 보통 대회당 80~100만원(4라운드 기준)의 기본급을 받는다. 여기에 톱10, 톱5, 우승 등 성적에 따른 보너스는 따로 지급된다. 남자 선수들은 캐디에게 적잖은 돈을 지급하는 만큼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린 경사를 잘 읽는 캐디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실력 있는 캐디를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 캐디들은 한 시즌 일정이 꽉 차있고 고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선수들의 캐디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KLPGA 투어에서 전문 캐디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KLPGA 투어 선수들의 캐디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라며 “여자 선수들의 백을 메는 게 남자 선수 캐디를 할 때보다 약 1.5배에서 2배 수입이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KPGA 코리안투어 상금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선수들의 사정은 그나마 괜찮다. 지난해 KPGA 코리안투어 상금랭킹 3위를 차지한 문도엽(28)과 SK텔레콤 오픈 우승자 권성열(33) 등은 전문 캐디와 따로 계약을 맺었다.
문제는 올 시즌 투어에 뛰어든 신인들과 하위권 선수들이다. 올 시즌 KPGA 코리안투어에 데뷔한 선수 중 몇 명은 캐디를 구하지 못해 부모님 또는 동료가 백을 메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올 시즌 신인왕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이재경(20)은 “프로 데뷔 첫 시즌인 만큼 전문 캐디를 따로 구하지 못했다”며 “시간이 되는 동료나 하우스 캐디를 구해서 올 시즌을 치를 것 같다”고 말했다. 안도은(28)은 캐디 구하기가 어려워 눈높이를 확 낮췄다. 그는 “거리와 그린 경사를 정확하게 읽지 못해도 괜찮다”며 “4일 골프장을 돌 수 있는 체력과 플레이에 방해되지 않는 캐디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디를 구하지 못한 선수들의 마지막 선택은 하우스 캐디다. 하우스 캐디는 대회가 열리는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로 코스와 그린을 꿰뚫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등이 들지 않은 만큼 전문 캐디를 고용했을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하지만 캐디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몇 선수들은 하우스 캐디와 대회를 치르는 걸 꺼린다. 정대억은 “하루에 최소 5시간 이상을 함께 보내야 하는 만큼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캐디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비용을 조금 더 내더라도 마음이 편안한 캐디와 함께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놓치면 안되는 뉴스
지금 뜨는 뉴스
추천 읽을거리
VOD 하이라이트
이데일리ON 오늘의 전문가 방송
이데일리ON 전문가 베스트
-
Best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
Best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
Best
서동구 매직차트
[매직차트] 빅데이터 + AI트레이딩 솔루션


-
Best
주식와이프
▶주식과 결혼하세요◀


![[단독] 롯데 관세 탈루 혐의 조사...관세청 수입 곡물 전반 확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1600855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