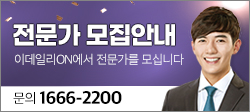[평창]총알처럼 빠르게, 거북이처럼 느리게

요안 클라레의 경기모습. 그는 지난 2013년 FIS 월드컵 남자 활강에서 시속 161.9km의 속도를 냈다.(사진=AFPBBNews)
[이데일리 평창특별취재팀 조희찬 기자] 눈으로 따라가기 힘든 아이스하키 퍽부터 슬로비디오 영상을 보듯 천천히 미끄러지는 컬링의 스톤까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보기만 해도 소름을 돋게 하는 스피드 종목부터 느려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까지 다양해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스피드 지존’은 우리
0.01초의 싸움 동계올림픽에서 짜릿한 속도를 즐길 수 있는 종목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아이스하키의 ‘퍽’은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지름 7.62cm, 두께 2.54cm의 손바닥 만한 퍽은 상대 골대에 시속 약 180km의 총알 같은 스피드로 날아가 꽂힌다. 프로야구 투수들이 던지는 강속구가 시속 160km 안팎인 점과 비교하면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다. 특히 온 몸에 체중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강력하게 내리치는 ‘슬랩샷’은 무시무시한 스피스와 파워를 겸비해 아이스하키의 박진감을 더 높여준다.
강력한 속도의 비밀은 스틱과 퍽의 소재에 숨어 있다. 선수들이 들고 있는 스틱은 강철보다 10배 강한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다. 고무를 압축해 만든 퍽 역시 탄성이 좋다. 이 모든 요소들이 아우러져 엄청난 스피드를 만들어 낸다. .
속도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은 루지와 스켈레톤 봅슬레이다. 경사 있는 얼음판에 선수들은 썰매에 몸을 맡기고 미끄러져 내려간다. 루지와 스켈레톤, 봅슬레이은 1km가 넘는 트랙을 질주하면서 가속도가 붙는다. 최대 시속은 거의 150km에 육박한다. 아이스하키 퍽이 날아가는 속도보단 조금 못 미치지만 루지와 스켈레톤, 봅슬레이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맨 몸으로 이 엄청난 속도를 견뎌내야 한다.
여기에 커브를 돌 때는 중력의 5배에 이르는 압력이 발생한다. 일반인의 경우 소위 ‘정신줄’을 놓을 만한 압박이다. ‘속도의 공포’가 찾아올 것을 알면서도 선수들은 시작할 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려가기 위해 죽기 살기로 썰매를 민다. 스타트 기록이 0.01초 줄어들면 최종 기록은 0.03여초 단축되기 때문이다.
보호장구 없이 160km를 넘기는 알파인 스키 활강도 ‘스피드 지존’으로 불릴만하다. 선수들은 출발점에서 결승선까지 시속 90km에서 빠르게는 150km의 속도를 낸다. 2013년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남자 활강에서 요안 클라레(프랑스)는 시속 161.9km의 속도를 내기도 했다.
◇‘빠른 게 다’가 아니야
‘느림의 미학’이 빛나는 종목도 있다. 대표적인 종목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총 102개의 금메달 중 11개가 걸려있는 바이애슬론이다. 바이애슬론은 스키를 타며 사격을 해야하는 종목이다.
바이애슬론도 결국엔 승패를 시간으로 가리지만, 무작정 서두른다고 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다. 세계적인 스키선수들의 주행 능력은 상향 평준화 돼 있고 결국 사격에서 승부가 갈린다.
사격에서 한 발이라도 놓치면 선수들은 1분의 페널티를 받거나 150m 벌주를 돌고 와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운동장 골대 찍고 오기’처럼 벌주는 말 그대로 타깃을 놓친 벌로 더 뛰어야 한다는 뜻이다. 선수들은 벌주를 하면 30초 가까이 시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격할 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고 조준한다.
느린 종목을 논할 때 컬링도 빼놓을 수 없다. 컬링의 스톤은 투구(딜리버리)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일반인의 보폭 정도로 원(하우스)를 향해 미끄러진다. 컬링은 하우스 한가운데 있는 버튼에 스톤을 누가 더 가까이 놓느냐를 놓고 겨루는 경기기 때문에 속도가 능사는 아니다. 천천히 미끄러져도 더 정확히 타깃에 위치하는 게 중요하다.
여유 넘치는 스톤과 달리 선수들의 빗질(스위핑) 속도는 빛의 속도로 이뤄진다. 스톤 투구 한 번에 선수들은 많게는 1000번 가까이 빗질을 하기도 한다.

바이애슬론 사격 장면(사진=AFPBBNews)
저작권자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놓치면 안되는 뉴스
지금 뜨는 뉴스
추천 읽을거리
VOD 하이라이트
이데일리ON 오늘의 전문가 방송
이데일리ON 전문가 베스트
-
Best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
Best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
Best
서동구 매직차트
[매직차트] 빅데이터 + AI트레이딩 솔루션


-
Best
주식와이프
▶주식과 결혼하세요◀


![[단독]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빨간불...4500억 블루원 매각 무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300829t.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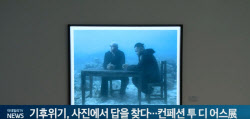
![(영상)우리 헤어지지 말자[이혜라의 앵커나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200546t.jpg)

![(영상)경기부양=증시부양[이혜라의 앵커나우]](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4/PS24042200522t.jpg)